■ 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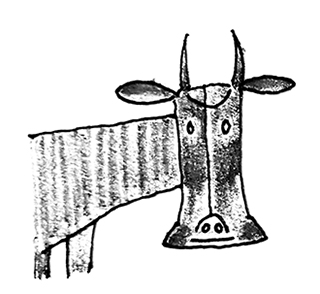
# 지난 8월 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물난리 속에서 신문의 보도사진 한 장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전남 구례의 한 마을 주택 지붕에 소 서너마리가 비에 젖은 채 올라서 있는 장면이었다.
이 소들은 주변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들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져 떠다니다가 마을회관 지붕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 그러다 물이 빠지자 사흘 만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이중 암소 한 마리는 구조돼 주인을 찾은 뒤 바로 다음날 새끼를 순산하기도 해 마을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송아지들을 이끌고 사찰로 피난간 소떼도 있다. 섬진강 홍수피해로 축사를 빠져나온 소떼 10여 마리가 도보로 1시간 거리인 해발 531m의 산속 암자(구례군 사성암)까지 올라왔다. 한 방송사는 ‘폭우 속 소들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타이틀로 이 소들의 폭우 속 피난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암자의 스님은 “소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얌전히 절에서 쉬다 떠났다”고 말했다.
# 소설가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1892~1950)는 소띠해인 1925년 을축년 새해 초에 《조선문단》이란 잡지에 <우덕송(牛德頌)>이라는 수필을 발표, 소의 덕을 기렸다.
- ‘그(소)는 말의 못믿음성도 없고, 여우의 간교함, 사자의 교만함, 호랑이의 엉큼스럼, 곰의 듬직하기는 하지만 무지한 것, 코끼리의 능글능글함, 기린의 오입쟁이 같음, 하마의 못생기고 제 몸 잘못거둠, 이런 것이 다 없고, 어디로 보더라도 덕성스럽고 복성스럽다.…(중략…)소! 소는 동물 중에서도 인도주의자다. 동물 중의 부처요, 성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마따나 만물이 점점 고등하게 진화돼 가다가 소가 된 것이며, 소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거니와, 아마 소는 사람이 동물성을 잃어버리고 신성에 달하기 위해 가장 본받을 선생이다.’
# 시인 김종삼(金宗三, 1921~1984)은 모두가 도회지로 떠나버린 시골에 홀로 남은 할머니와 그 할머니와 일상을 같이 하는 소의 모습을 <묵화(墨畵)>라는 시를 통해 마치 수묵화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조금은 외롭고 쓸쓸하게 그렸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1969)
온종일 들녘에 나가 멍에를 목에 얹고 말없이 써레질이나 쟁기질을 했을 소의 궂은살이 박인 목덜미를, 할머니의 거친 손이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고단했을 하루를 위로한다. 여기서 소는 할머니의 반려이자 삶의 의지다. 소는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다. 우리 민초들에게 있어서 소의 의미는 그래왔다, 소는. 이제 90여 일이 지나면 새로 맞을 내년-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