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기자의 ‘세상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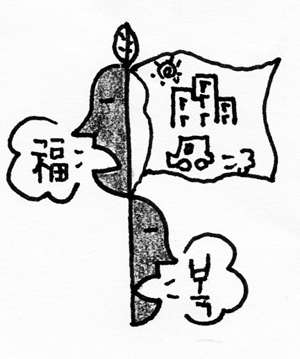
새해처럼 말[言] 인심이 후해지는 때도 없다. 한 해 내내 무심하게 지내다가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가 되면, 마음이 넉넉해져 허례(虛禮)같으나마 주윗사람들의 한 해 안녕과 행운, 그리고 복을 빌어준다. 살기가 팍팍해도 돈 드는 일 아니니 주저하거나 가림이 없다. ‘덕담(德談)’이란 게 그렇다.
대개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훈훈한 가르침의 말을 일러 덕담이라 하지만, 새해에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주고 받는 좋은 인삿말로도 통용된다.
예전 고향마을에서는 새해 설 명절(물론 구정이다)이 되면 설빔을 곱게 차려 입고 일찌감치 차례를 지내고 성묘(省墓)를 마친 뒤에는 마을 집집마다 돌며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했다.
공손히 큰 절을 올린 후 “과세(過歲) 평안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만수무강 하십시오.” 등등의 새해 인사를 올리면, 어른들은 “그래, 복 많이 받아라.” “새해엔 공부 잘 하고…” “좋은데 취직 됐다지? 축하하고 고마운 일이네.” “부모님께선 건강하시지? 자주 찾아뵈어라.” 등등의 훈훈한 덕담을 해 주고 세뱃돈과 함께 다과상을 차려 내왔다. 그런 세배분위기는 정초부터 시작해 정월 대보름 때까지 이어졌다.
그런 정겨웠던 옛 설 풍습은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시나브로 자취를 감추었다. 문명의 비곗살을 늘리며 악다구니로 해가 지고 해가 뜨는 현대인들의 살벌한 삶터엔 온갖 비행과 악담(惡談)들이 억센 잡초처럼 무성하게 차고 넘쳐난다.
그 메마른 땅에 해마다 이 사회의 정신을 이끌어 가는 종교지도자들이 ‘신년메시지’란 이름의 메아리 없는 공허한 덕담을 던진다. 천주교의 염수정 추기경은 “우리 주변의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주고, 그들을 위해 따뜻하게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그들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새해에는 화합하고 인성 도야(陶冶)에 힘쓰자.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난과 비애를 들어주고 고통을 대신 앓아주자”며 ‘화합’을 힘주어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2015년엔 우리 사회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세상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 덕담들을 편안하게 품어안기에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너무도 멀리 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해 첫머리에 저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작은 티벳’이라 불리는 인도의 라다크 속담 하나 새해 덕담으로 한번 새겨보는 건 어떨까 싶다. - ‘호랑이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