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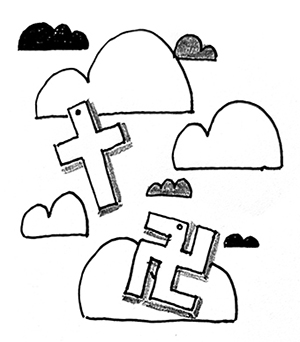
#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평생의 삶을, 인생을 그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의 말들이 달라진다. 살아서 마지막 온 몸의 힘으로 밀어올려 세치 혀를 달싹이게 하며 내뱉는 마지막 숨같은 몇 마디 말들에 따라 품위·격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솔직한 생활의 구체성이 드러난다.
사람에 따라서는 깊은 내공으로 다져진 ‘성실한 노동의 세월’도 눈물겹게 그 마지막 말 속에서 반짝인다.
# 역사 속 우리의 옛 선인들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말, 말하자면 ‘유언’들을 보면, 단편적이나마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나 인간적인(혹은 개인적인) 욕심까지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드디어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한을 토로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인생이란 원래 뜬구름처럼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라며 허허실실의 인생철학을 내뱉았다.
그런가 하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나를 조상님들이 계신 함흥땅에 묻어다오.”했고, 그의 아들인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은 “내 상중에는 주상(세종임금)께 고기반찬을 드시게 하라. 양녕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지극히 가부장적이고도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말을 남겼다.
연산군은 “중전(왕비)이 보고 싶구나!” 했고, 대유학자 퇴계 이황은 “저 매화, 물 줘라!”며 격조는 다소 있지만 생활의 구체성은 모자라는 (조선 선비들이 대체로 그러했듯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또한 다소 직설적인 성격이 들여다 보이는 마지막 말을 한 이들도 적지 않다.
사명대사(유정)는 “이 세상에 조금만 머물려 했는데, 뜻밖에도 오래 머물렀구나!” 했다.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국문(임금의 직접심문) 끝에 대역죄로 능지처사(머리·양팔·양다리·몸통의 여섯 부분으로 몸을 찢어서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 경계케 하는 형벌)를 당하면서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소!” 했다.
김삿갓은 “저 등잔불을 꺼 주시오.”, 고종비 명성황후 민비는 일본군에게 잡혀 시해당하기 전에 “살려 주시오!”하며 목숨을 구걸했다.
# 최근 국내 최고령인 94세의 현역 여의사로 활동했던 한원주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과장이 별세하면서 그녀의 삶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되고 있다. 1926년생으로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수십 년간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기쁘게 살며, 내 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사랑으로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인술을 펼쳐왔다.
그런 그녀가 노환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길을 떠나기 직전, 가족과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단 세 마디였다. 조용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커다란 울림을 주는 그 세 마디의 말… 그 안에는 진정어린 그녀의 따뜻한 헌신과 사랑 가득한 배려가 녹아들어 있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세상은 살기 힘들다지만, 그런 가슴 따뜻한 정인들이 있어 아직은 그런대로 견디며 살 만하다. 아! 가을이 깊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