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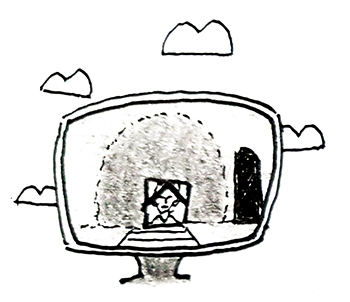
죽은 조상을 위하는 제례(祭禮)는 핏줄을 재확인하는 행위로서 한국인의 ‘평생도(平生圖)’ 그 자체였다. 죽으면 초상을 치르고, 그 혼백을 집 마루의 한 공간에 모시는 상청(喪廳)을 설치했다. 상청에 혼백(신주)을 모시는 행위는, 죽었지만 3년간 살아있는 노인(가족)으로 대접하는 예법이었다.
보통은 죽은 뒤부터 탈상 때까지 3년동안 장남집 마루에 혼백을 모시고 매일 살아있을 때처럼 삼시 세끼 상식(常食)을 올렸다. 계절따라 새로 나는 햇과일이나 별식을 해도 제일 먼저 상청에 올렸다.
그렇게 해서 3년 탈상이 끝나면 한 해에 적어도 네 번(본인과 배우자 기제삿날, 추석·설날의 차례 때) 이상 살아있는 자손들의 대접을 받았다. 이 제례행위는 보통 4대에 걸쳐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된다. 죽어도 ‘가족’이라는 혈연의식으로 끈끈히 엮여 영원히 살아있는거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죽기 전에 죽은 뒤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었을 때 입을 수의를 장만하고 묘자리를 미리 정해 놓았다.
이 모두가 혈연·집단의식에서 비롯된 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살아있는 자손들은 자손들대로 ‘죽은 조상이 산 자손들의 삶에(길·흉·화·복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조상을 위하는 일에는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한다.
지금은 AI(인공지능)세상인데도 여전히 ‘조상 덕’, ‘조상 탓’에 목 맨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죽은 조상의 관을 어깨에 떠메고 기를 쓰고 ‘풍수명당(風水明堂)’ 찾아다니는 권문세족(權門勢族)들이 우리 사회엔 아직도 많다.
조선조 중기 때 대학자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당대 향촌(鄕村)의 농민계층 지배강화를 위해 윤리규범으로 기초한 <예안향약>에 보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자,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자, 집안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자는 극벌(極罰, 극한 형벌)(상·중·하)에 처한다’고 했다.
이퇴계의 이 향약 규범들은 이미 불과 반세기쯤 전에 ‘허례허식’이라 해 헌신짝처럼 내버려졌고, 그때라면 몰라도 ‘간소화’란 이름으로 인륜에 바탕한 조상제례를 떨쳐내는 일이 극벌에 처해 마땅한 일인지조차 모호한 세상이 돼 버렸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기간 고향방문·성묘를 자제해 달라며, “온라인 성묘와 벌초 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물론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 정부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절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성묘’는 기본 예법에도 맞지 않고 생뚱같다.
예법을 따를 양이면 간소화 해서라도 제대로 기본격식을 갖추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흐름 따라 아예 거두어 내모시는 것이 옳다. 조상을 정성으로 위하고 받드는 일은 정신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