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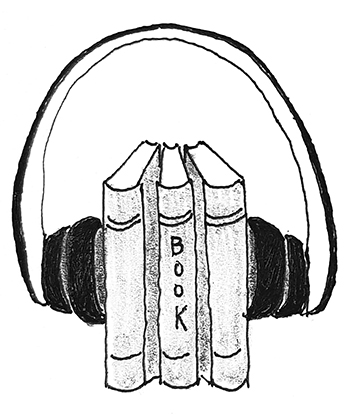
‘먼 산이 불려나온 듯이 다가서더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산들산들한 맛이 베적삼 소매 속으로기어든다. 벌레가, 달이, 이슬이, 창공이 유난스럽게 바빠할 때, 이 무딘 마음에도 먼지 앉은 책상 사이로 기어가는 부지런이 부풀어 오름을 금할 수 없다.’
1세대 국어학자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1896~1989)의 수필 《청추수제(淸秋數題)》중 ‘독서’를 주제로 한 글의 일부다.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수록돼 있기도 한 이 수필은, 1938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수필잡지 <박문(博文)> 창간호(32면)에 게재돼 ‘독서의 계절, 가을’을 주제로 한 명수필의 새 지평을 열었다.
지금이야 여름·겨울 가릴 것 없이 냉·난방기가 펑펑 돌아가니 딱히 책 읽기 좋은 철을 가릴 필요가 없지만, 예전엔 으레 가을이 되면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니, ‘독서의 계절’이니 하며 나라 안 문화계·교육계가 나서서 부산을 떨었다. 이희승 수필 《청추수제》의 5가지 글감 중 ‘독서’란 소제목의 글에서 인용한 당나라 도연명의 싯구절 ‘속대발광욕대규(束帶發狂欲大叫)’처럼, ‘푹푹 찌는 듯한 여름 더위에 옷을 갖춰 입고 앉아 있으려니, 그 더위와 괴로움에 미칠 것 같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은’ 한여름 더위가 가고, 산들산들 바람이 이는 청량한 가을이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 여겼던 것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60~70년대의 개발성장기를 거치면서 배고픔에서 겨우 벗어나자, 나라 안 문화계·교육계 식자층이 중심이 된 지적욕구의 사회 확산노력에 힘입어 ‘배워야 산다’며 책 읽는 독서문화가 나라 구석구석 생겨났다. 이때 생겨난 것이 직장이며 시골 구석구석 가가호호 방문월부판매를 했던 전집류 출판물들이었다. 지금부터 60년 전인 1959년 을유문화사가 국내 최초로 세계문학전집 완역본을 펴냈고, 삼성출판사, 정음사, 범조사, 민음사 등이 속속 문학·사상·전기류 전집물 출판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종이책 출판이 성시를 이루던 즈음, 1970년대 컴퓨터의 도입·보급과 맞물려 20년 전인1999년 10월 전자출판협회가 창립되면서 우리의 출판시장은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전자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오디오북이 등장하면서 종이책은 시나브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가 2년마다 조사 발표하는 <국민 독서실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종이책을 읽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책을 한권 이상 읽었다는 응답은 성인 59.9%, 학생이 91.7%로 2015년의 성인 65.3%, 학생 94.9%였던 것과 비교해 떨어졌다.
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이 주인 전자책 독서율은, 다양한 콘텐츠개발과 갖가지 서비스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활자읽기와, 그 행간을 통한 지적사고와 정서함양이라는 종이책 본연의 순기능은 점점 사그라든다. 그러는 사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시·때·장소 구분 없이 이동 중에도 독서가 가능한 행위로까지 확대된 전자책이, 읽는 책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독서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구시대의 틀에 박힌 맥없는 슬로건은 퇴색해 보인다. 그래도 정부는 여전히 ‘9월은 독서의 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