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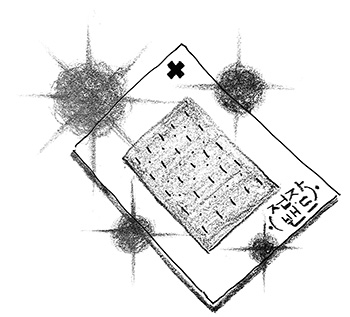
“엄마손은 약손~ 울애기 배는 똥배~”
할머니의 “할미손은 약손~”으로부터 전승된 ‘엄마의 약손’은, 어렸을 적 만병통치의 처방이었다. 배가 싸르르 아픈 횟배앓이를 할 때도, 몸살기로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에도 배를 살살 문질러 주고 이마를 그윽히 짚어주던 할머니·어머니의 ‘약손’은 희한하게도 약발이 서 난 스르르 잠에 빠져들곤 했다. 기막힌 1차 처방이었던 셈이다.
하긴 40리 먼 읍내에나 가야 약방·의원이 있었으니, 별안간 숨이 넘어간다 해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런탓에 인증되지 않은 민방비법도 가전처럼 집집마다 전해내렸다. 이를테면, 급히 체한 데는 집 뒤꼍 습한 곳에서 자라는 질경이 뿌리를 캐어다 사발에 넣고 짓찧어 그 즙을 마시게 한다든지, 한여름 더위 먹은데는 집담장 둘레에 댑싸리처럼 자라는 익모초를 삶아 그 쓰디쓴 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 이었다.
증세가 심한 응급상황이 오면, 동네에서 한문글방을 운영하면서 사관침을 놓기도 하는 ‘글방할아버지’를 모셔다 침을 맞게 하거나, 오리 쯤 떨어진 앞동네에 달려가 ‘백의사’란 별명이 붙은 이 (그는 군대시절 위생병으로 있다가 제대 후 면허 없이 시골동네에서 의료행위를 했었다고 뒤에 들었다)의 자전거왕진을 청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읍내 병원이나 수원에 있는 도립병원으로 갔다.
동네 연쇄점에서도 생필품과 함께 소화제·진통제 정도의 간단한 약은 팔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서울이나 읍내 나들이 길에 식구들이 상용할 가정상비약을 사다 눈에 잘 띄는 안방 장롱 화장대 위에 죽 놓으셨다. 소화제의 대명사라 할 달달한 활명수와 구수한 원기소(정제), 두통약인 뇌신, 상처치료제로 ‘빨간약’이라 불린 옥도정기(머큐로 크롬, ‘아까징끼’라 부르기도 함), 종기에 붙이는 ‘이명래 고약’, 삔데 붙이던 화~한 신신파스 등 이었다. 이 상비약을 얻으러 와 다급하게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이웃도 여럿 있곤 했다.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 흑백텔레비전이 보급되기도 훨씬 전인 50~60년 전의 일이니, 지금의 보건의료환경에 비하면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수술부위에 세포성장을 촉진하고 조직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해 상처가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을 4분의 1로 줄인 기술로 만든 ‘전자약 밴드’가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개발돼 ‘전자약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상처엔 ‘연고, 반창고’ 하던 것이 이젠 ‘전자약 밴드’ 하나면 끝이다.
‘전자약’은, ‘전자(일렉트로닉, electronic)’와 ‘약품(파머수티컬, pharmaceutical)’의 합성어다. 신경을 자극해 비만이나 관절염을 치료하는 전자약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복잡한 시술이나 장비 없이 붙이기만 하면 상처 진단과, 전기자극에 의한 약물치료까지 하는 전자약 밴드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전자약 시대를 크게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의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KAIST) 전기·전자공학부와 서울대 분당병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두께 1mm도 안되는 밴드에 발광다이오드(OLED)와 배터리를 집어넣어 ‘빛’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광 치료 전자약’을 개발해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행여 어머니와 같은 노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머리띠 모양의 전자약 밴드 개발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망상일까…?
이런 추세대로 전자약이 개발·발전돼 간다면, 이젠 동네병원을 구경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