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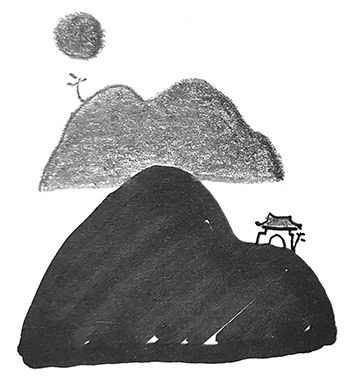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틔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 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 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ㅡ박두진(1916~1998), 시 <청산도(靑山道)>
지금 온천지가 짙푸른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데, 인간 세상엔 온통 힘 있는 자들이 쏟아낸 위선과, 순수를 가장한 교활함이 넘쳐난다. 고성과 막말, 헐뜯기로 날이 샌다. 시대를 닮아갈 이들이 생각을 그르치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유들 속에서 생각을 바로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믿고 기대왔던 이 땅의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있다. 투사처럼 권좌에 올라 선 이들은 자신들이 쓰고 남는 것을 못 가진 이들에게 여투어주려는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다. 누가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가. 사회 구석구석 팽배한 불신, 비관과 회의가 난무하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희망’이란 창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겐 내일이 없다. 오로지 눈물과 좌절 뿐이다.
이 땅의 정신을 회복시켜 줄 ‘눈 맑고 가슴 맑은 볼이 고운 나의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가슴 속에 보듬은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은 따사로운 한줄기 햇살 같은 위안이다.
‘어이할꺼나/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남 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미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 또 한번 날 에워싸는데 // 못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 /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 내려 // 신라 가시내의 숨결과 같은 / 신라 가시내의 머리털 같은 /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 내려// 올해도 내 앞에 흩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ㅡ서정주(1915~2000), 시 <신록 (新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