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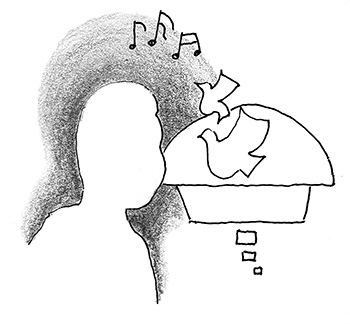
3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고향마을의 ‘명가수’셨다. 해마다 설과 추석명절에 마을에서 열리는 ‘콩쿨대회’는 도맡아 놓고 1등상을 휩쓸었다. 올백으로 빗어넘긴 반곱슬머리에 반듯한 이마를 조아리며 지그시 눈을 감고 ‘뽕짝’이라는 흘러간 옛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제꼈다. 레퍼토리는, 1940년대에 ‘애수의 소야곡’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른 남인수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백년설(본명 이창민)의 노래들 ㅡ ‘나그네 설움’(1940, 조경환 작사·이재호 작곡), ‘번지 없는 주막’(1940, 추미림 작사·이재호 작곡)과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1950, 반야월 작사·김교성 작곡), ‘물방아 도는 내력’(1953), 한복남의 ‘엽전 열닷냥’(1955), 김용만의 ‘남원의 애수’(1957), ‘효녀 심청’ 등이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ㅡ백년설, ‘나그네 설움’
1927년생 이시니까 살아계시면 올해 93세다. 지금 주한 미군이 이전해 간 평택의 고향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한 동네 처녀인 세살 아래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동네 인근의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스) 노무직으로 평생을 보내셨으니, 그 야말로 순고향토박이다. 6·25전쟁이 끝나갈 무렵 사지(死地)로 끌려가듯 입대해 최전방에 있다 만 5년만에 제대한 군생활 말고는 단 한번도 고향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으신 아버지에게 ‘18번’들의 노랫말처럼 그 무슨 한이, 실향의 시린 서러움이 가슴 속에 쌓여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 흔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없는 형편에 그 많은 흘러간 옛노래들의 곡조며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빼곡하게 머릿속에 쟁여놓으셨는지 어린 나로서는 늘 불가사의였다.
언젠가 할머니께서 “늬 애비 가수되겠다며 집 나간 적 있었다” 하신 말씀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다. 그때 도미란 가수의 ‘청포도 사랑’(1958)에 필이 꽂혀 가수의 꿈을 가졌었다는 얘길 한참 뒤에야 아버지께 들으며 함께 웃었었다.
그러나 삶은 팍팍하고, 새끼들 다섯이 3~4년 터울로 줄줄이 태어나자 자식들 ‘머리농사’에 허리 펼 겨를도 없었고, 당신의 가수에의 꿈은 한순간에 꺾여버렸다. 그 미련은 미명처럼 이따금씩 퇴근 후 어머니께서 챙겨드리는 막걸리 두어잔에 힘을 실어 처량하게 새끼들 떠나가 텅빈 집 담장을 넘곤했다. 지난날의 ‘18번’들이…
요즘 TV고 라디오고 ‘트롯(Trot)’이 대세다. 지난 날, 아버지께서 이승에서 못다 부른 뽕짝 ‘18번’은,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한 나이를 살고 있는 아들이 이따금씩 아버지를 그리워 하며 울면서 부른다.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넘는 우리 님아 / 물항라 저고리가 궂은 비에 젖는구려 /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 박재홍, ‘울고 넘는 박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