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김경미과장
병을 치료하다가 완치가 어려워 사별을 앞둔 환자의 아픔과 가족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들의 아픔을 완화해주고 슬픔을 위로해주는 호스피스제도와 호스피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아주대학교 병원의 완화의료센터 김경미 과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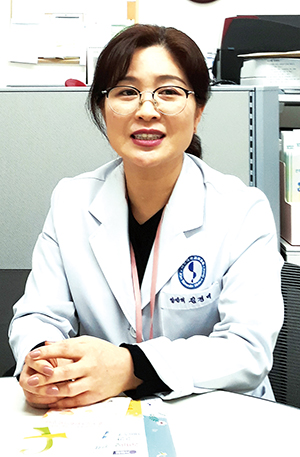
호스피스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연명의료의향서를 낸 환자에겐
정부에서 입원비․특진 지원
치료불가 환자 통증완화부터
신체적 증상 완화, 영적 위로까지...
먼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어떤 것인지 들어봤다.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와 가족들이 사별을 접하는 과정에서 맞는 신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슬픔,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김 과장은 말을 이어갔다.
“말기 암환자는 치료를 해도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고 몸도 쇠약해져 치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치료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암환자 99%가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어요. 비암성 호스피스 치료자는 1%에 불과합니다. 법에 규정된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는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임종을 앞둔 만성간경화증 환자,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는 통증과 신체적 증상 완화, 환자와 가족의 병에 얽힌 심적 고통 완화, 위로와 영적인 문제까지 폭넓습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필수요원
목사·신부·스님 등이 종교적 치료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개 직종을 필수요원으로 한 팀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들 요원들은 국가에서 규정한 관련 필수교육을 60시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김 과장은 간호대학 대학원과정을 졸업한 뒤 아주대 암환자실 일반병동에서 근무를 하다 2010년 호스피스업무에 지원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주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종양혈액내과의사 3명, 통합의학센터 의사 1명, 마음건강클리닉 의사 1명 총 5명의 의료진과 1급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4명의 법적 필수요원으로 구성돼 있다.
아주대 병원에서는 이런 필수요원 외에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을 영적 위로와 복음치료로 돌보기 위해 목사와 전도사, 수녀와 신부는 물론, 병원 내에 조그만 법당까지 마련해 주지스님과 같은 종교인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영적 위안을 주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고 했다. 종교를 갖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과정도 있다.
무신론자도 죽음을 앞두고는
종교에 귀의해 심신 고통 견뎌내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생명을 마무리할 즈음엔 종교에 귀의해 기대려고 하더군요. 이런 분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안도감과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무교인보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종교에 의지해 심적 고통을 잘 견뎌내더라고요.”
호스피스 치료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담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입원형 치료, 병원 내 일반병동 병실과 외래에서 의료진의 순회 진료와 면담치료를 받는 자문형 치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의료진의 가정방문치료를 받는 가정형 치료 등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관련해 말을 이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불시에 죽음을 맞을 큰 병에 걸릴 수 있지요. 이런 때를 대비 자녀나 다른 사람이 하기보다 건강할 때 본인의 생애에 마지막 의료행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사전에 잘 생각하고 의료계획의향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의 수고와 걱정을 덜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죽음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향서를 써 두는 게 좋습니다. 정부도 복지차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게 입원비와 특진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이 줄여주므로 이점을 잘 살펴 치료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삶 포기한 환자들도 임종 때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 보여
이어 사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환자들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굉장합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가도 된다’고 말하다가도 막상 임종을 앞둔 상황이 되면 ‘살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삶의 애착과 가족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거죠. 자녀가 어리거나 아니면 노부모가 살아계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생명의 끈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하지요.”
환자 대부분이 죽을 때를 미리 짐작하고 있다고 김 과장은 말한다.
“병실에서 환자 상담을 마치고 막 문을 열고 나설 때 환자들이 ‘선생님’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돌아서면 저를 보고 ‘그 동안 감사했어요’라며 인사를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다음날 다시 병실에 왔을 때 환자가 임종을 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땐 전 돌아서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천국에서 행복하세요’라고 빌지요.”
환자가 임종 전에 어떤 얘기를 남기는지도 들어봤다.
“주로 즐거웠던 것, 용서가 필요했던 것, 못 다한 것,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웠다. 당신을 만나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 행복했다 등의 말을 합니다. 연세가 있는 분은 배우자 속을 썩인 것과 경제적인 것에 소홀했던 것, 외도를 한 것에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고 갑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겐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시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를 꼭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시죠.”
끝으로 김 과장은 환자를 돕는 것보다 환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에 느끼는 허전함과 상실감을 함께 나누며 진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다듬을 때가 참으로 고맙다며 호스피스 일에 소명을 느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