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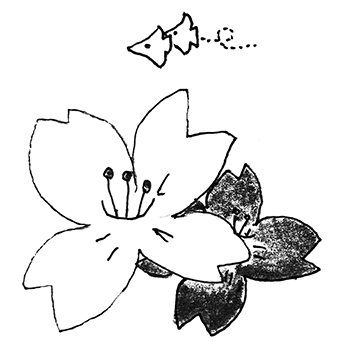
봄은 소리로부터 온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몸 푸는 소리, 몸 푼 무논의 봄물 쓸리는 소리, 그리고 알싸한 봄내음 머금은 흙바람 소리… 닷새거리로 새 바람이 불고, 그 꽃샘바람 따라 봄비 따라 갖가지 꽃나무들이 잎보다 먼저 차례로 꽃을 피운다. 매화-산수유-개나리-진달래-목련꽃-배나무꽃, 복숭아꽃… 그리고 그 꽃잎, 꽃길에 서늘한 산이 어린다.
‘우수도/경칩도/머언 날씨에/그렇게 차거운 계절인데도/봄은 우리 고은 핏줄을 타고 오기에/호흡은 가뻐도 이토록 뜨거운가? /…/(중략)…//산은/산대로 첩첩 쌓이고/물은/물대로 모여 가듯이//나무는 나무끼리/짐승은 짐승끼리/우리도 우리끼리/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신석정(1907~1974), 시 <대춘부(待春賦)>
온갖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물의 은혜를 두루 미치게 하는 비[雨]의 절기, 하늘의 양기가 내리고 땅의 음기가 올라 서로 화합해 초목이 싹트는 24절기의 두 번째 절기-우수(雨水, 2월19일)가 두 이레 전이었고, 이틀 뒤면 개구리가 땅 속 겨울잠에서 화들짝 깨어나 놀라 뛰쳐나온다는 경칩(驚蟄, 3월6일)이니, 정녕 봄은 저만치에 와 있다.
‘아무도 먼저 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먼저 가 꽃 피워놓고 기다리는 것이 봄이다.//어제 길 끝에 앉아 기다리던 사람을 위해 연두빛 언덕을 내려보내는 것이 봄이다.//낯선 것들을 낯익은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맨발로 마중 가도 발 아프지 않은 것이 봄이다.//작은 삶이 큰 삶을 껴안는 것이 봄이다.’ -이기철(1943~), 시 <봄>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꽃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내음새.//어느 것 한가진들 실어 안오리/남촌서 남풍(南風)불 제 나는 좋대나.//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가진들 들려 안오리/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대나.’
-김동환 (1901~ ), 시 <산 너머 남촌에는 >
세상 꼴이 험해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네 가슴도 동지섣달에 얼었던 강물이 풀리듯, 오는 봄엔 따스한 훈풍 속에 눈 녹듯 녹아 물 흐르듯 흘렀으면 좋겠다. 뭐니 해도 네 계절을 누리고 사는 복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라구….
오는 봄엔 푸릇푸릇 돋아오르는 봄 풀빛 밟아가며 다지듯 그래도 희망이란 걸 쏘아올려 볼 일이다.이 봄엔 가난한 우리들의 밥상에도 풋풋한 봄이 다발로 묶여오르는 눈물겨운 성찬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