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수필-귀농아지매 장정해 씨의 추억은 방울방울
엄마의 가게가 그립고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것에
섭섭함도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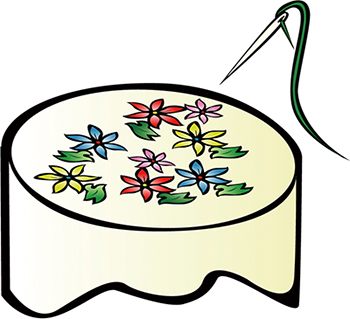
김장도 끝나고 메주도 몇 장 만들어 매달고 한 해를 마감할 즈음이면 마을도 농한기에 든다. 모처럼만에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괴산 장에 나가 목욕하고, 국밥도 먹고, 털신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해는 돼지해라며 출생한 띠 이야기가 나왔다. “난 양띠” “난 개띠” “난 원숭이띠”... 누구는 “무슨 띠?” 하면서 나이 자랑이다. 어르신을 내려드리고 추위가 한층 누그러진 한낮의 햇살을 받으며 호수같이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니 원숭이띠였던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그분과 같을텐데~~
아버지가 제대를 하고 부산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엄마 고향인 진해로 들어와 중앙시장 한복판에 작은 수예점을 열었다. 진해는 일제 때 일본이 군사목적으로 만든 군항도시로 한국 최초의 계획도시다. 중원로타리를 중심으로 남원, 북원로타리로 연결돼 그림을 그린 듯 반듯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일본의 잔재이기는 하지만 한국근대사를 대변하는 가옥, 건축물, 시가지 등은 주변 도시와는 사뭇 달랐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자라고 살아왔던 삶의 자양분을 제공한 배경이 진해 시장통 엄마의 가게였다. 엄마 가게의 주 고객은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에서 내려온 수준 높은 사모님, 딸자식 결혼에 베개, 밥상보 등을 장만해주려고 오는 분, 여중고의 가정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자수를 실습하기 위해 가정시간 준비물로 사려고 찾는 학생 등이었다. 50여 년 전, 그 당시 사치품에 속하는 수예품을 팔다 보니 가난한 삶에 묻혀 있었던 엄마의 내재된 미적감각이 발산됐다. 부산에서 물건을 골라 떼어오면 진해의 웬만한 가정집에 한 벌씩 다 가져갈 정도로 물건이 없어 못 팔았다. 어린 내가 봐도 엄마의 색감은 강렬하고 섬세하고 하려하고 아름다웠다. 그 덕에 적은 자본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며 가게를 키워나갈 수 있었고, 그 당시 진해의 대통령 별장에 방석, 쿠션, 커튼 등 인테리어를 맡아 하시기도 했다.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나 결혼해 둘째아이의 첫돌이 지나고 남편이 해외근무로 외국으로 떠나게 돼 친정엄마의 집으로 내려갔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홀로 사시던 엄마에게 우리들의 귀환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작은애와 내가 집에서 살림을 살고 엄마는 큰애를 데리고 가게로 나가셨다. 점방문을 열고 물건을 내다 걸고 색색의 실들을 진열하면 큰애는 있는 듯 없는 듯 다양한 색실에 팔려 긴 대바늘로 갖가지 실을 꿰기도 하고 늘어놓고 소꿉을 살며 재미있어 했다. 가게에 북적거리는 사람도 보고 물건을 팔고 사는 것도 보았다. 딸애에겐 서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걸 경험하는 신기한 나라로 들어간 것이다.
큰딸은 무엇이든 자기편이 돼주고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따라 가게 나가기를 좋아했다. 화려한 색상과 무늬, 보드랍고 빳빳한 천의 질감, 색실, 할머니가 사놓은 동화책 음악책 등등 딸애 것으로 가게 한구석이 가득했다. 그렇게 두 해 넘게 엄마의 가게에서 살았다.
지금은 진해도 너무 달라져서 옛 정취를 찾을 수가 없다. 주변도시와 비슷해지고 평범해져버렸다. 유럽에 가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어 옛것이 보존돼 있던데, 달라진 진해는 옛 모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작은 딸은 월급쟁이고, 그래도 큰딸은 자기 사업을 한다. 서울시에 뽑혀 내년엔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오래된 기억, 작은 도시 시장통에 있었던 엄마의 가게가 그립고,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지만 거기에서 자라온 자식들이새 세대를 이끄는 문화트렌드로 다시 꽃피워 나가기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