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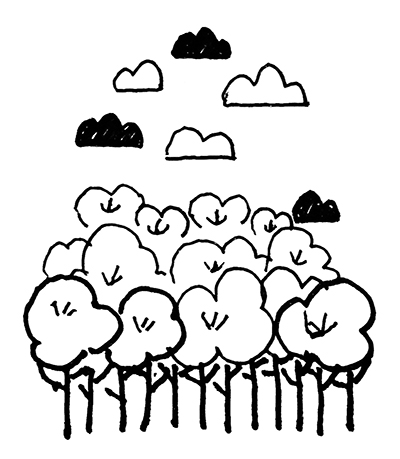
4월이다. 문밖은 온통 꽃세상이다.
‘꽃무더기 세상을 삽니다/고개를 조금만 돌려도/세상은 오만가지 색색의 고운 꽃들이/자기가 제일인 양/활짝들 피었답니다/정말 아름다운 봄날 입니다/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감사한 마음이고/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꽃들 가득한 4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 입니다/눈이 짓무르도록/이 봄을 느끼며/가슴 터지도록/이 봄을 즐기며/두발 부르트도록/꽃길 걸어 볼랍니다/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진심으로 사랑합니다/4월이 문을 엽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마르지 않는 신앙의 샘에서 맑은 영혼을 시로 길어올리는 이해인 수녀(1945~)의 시 <4월의 시>다. 그런가 하면, 먼 지난 날 학교시절, 4월이면 줄줄 외고 다니던 T.S 엘리엇의 <황무지(The Waste Land)>(1922)란 시의 첫 구절도 머릿속을 맴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꽃을 피우며/추억과 욕망을 섞으며/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이렇게 엘리엇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세상을 노래했다면, 박목월 시인(1916~1978)은 6·25전쟁의 아픈 생채기를 <4월의 노래>란 시로 어루만져 주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구름꽃 피는 언덕에서/피리를 부노라/아 멀리 떠나와/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돌아온 사월은/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빛나는 꿈의 계절아/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그러나 이 땅의 4월은 4·19라는 커다란 역사의 능선을 넘으며 ‘제 정신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했다. 신동엽 시인(1930~1969)은 <4월은 갈아 엎는 달>이란 시에서 이렇게 절규했다.
‘4월이 오면/곰나루에서 피 터진 동학의 함성,/광화문에서 목 터진 4월의 승리여.//강산을 덮어, 화창한/진달래는 피어나는데,/출렁이는 네 가슴만 남겨놓고, 갈아 엎었으면/이 군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갈아 엎었으면/갈아 엎은 한강연안에다/보리를 뿌리면/비단처럼 물결 칠, 아 푸른 보리밭’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4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며,‘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모으든 쇠붙이는 가라'고 피울음 토하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도 4월이 되면 절절하게 가슴을 친다. 정말 그렇게 출렁이는 가슴들만 남겨 놓고 군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 갈아 엎으면, 비단처럼 물결치는 푸른 보리밭을 볼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