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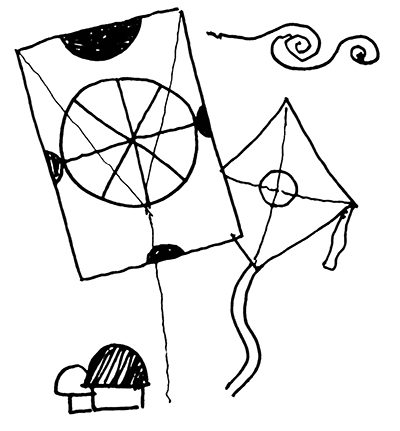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에게 정서적으로 진정한 새해 의미를 갖게 해 주는 건 음력설, 구정이다. 본디 우리 민족이 음력절기를 바탕으로 한해 살림살이를 마름질 해온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이라 이름에는, 새해 첫달의 첫날로서 ‘아직 익숙지 않은 날’, 새로운 해에 대한 ‘낯설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의미로 ‘신일(愼日)’이라고도 했다.
기록상으로 설의 역사는 멀리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뒤 고려시대에는 9대 명절의 하나였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한식·단오·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나로 받들어졌다.
그러던 것이 1896년 일제 강점기에 태양력 시행과 함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양력설’로 대체됐다. 8·15광복 후에는 이중과세와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음력설을 지냈는데, 그런 탓에 양력설은 신정, 음력설은 구정으로 불렸다. 이렇듯 양력설·음력설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민족고유 정체성을 내세워 1985년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4년 뒤인 1989년에 ‘설날’이란 이름을 되찾았고, 1991년부터는 3일 연휴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금이야 부모들이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역귀성하는 세태로 바뀌었지만, 당시만 해도 설날을 앞둔 전날에는 바리바리 선물꾸러미를 챙겨들고 고향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는 귀성객들로 서울역은 터져나 일대 ‘민족대이동’이란 말을 실감케 했다.
옛 음력설의 시작은 음력 섣달 그믐날부터 시작됐다. 그믐날과 초하룻날은 연결돼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믐날밤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속신에 따라 꼬박 날밤을 새우고 설날 아침을 맞았다. 설날 아침이 되면 새로 장만한 설빔을 입고 정성을 다해 장만한 음식으로 조상께 차례를 지냈다. 그런 다음에는 집안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듣고, 성묘를 가고 가까운 이웃어른을 찾아 세배를 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와 웃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일은 너나없이 따스한 정과 연대감을 나누고 확인하던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작은 설’이라는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윷놀이며 널뛰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의 민속놀이 역시 농경을 기본으로 했던 고대사회로부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감을 확인시켜 주던 미풍양속 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설의 모습들이 시나브로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 횡행하는 존속살인, 깨지고 부서져 가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속에서 ‘설’은 이미 낯선 옛풍경이 돼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