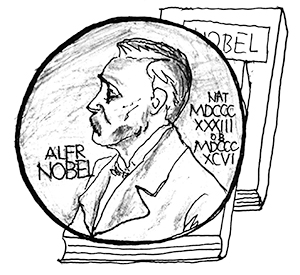
해마다 10월 초가 되면 문학인들과 독서애호가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 게 있다. 노벨문학상이다. 10월 초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시상식을 갖는 세계적 권위의 이 상을 행여 우리 문인이 받지는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 큰 것도 한몫을 한다.
1901년 제정됐으니 올해로 117년째가 되지만, 제 1,2차 세계대전 때 여섯해 시상식을 갖지 못했으니 시상식 횟수로 따지면 올해로 111회가 된다. 수상자는 작품이 아니고 ‘이상적(理想的)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준다’는 노벨의 유지에 따라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발표 즉시 수상작가의 작품이 장안의 지가를 올리며 독서애호가들을 불러 모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의 한 저명 일간지가 인터넷 서점인 YES 24의 맹렬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은?’이란 설문조사를 해 1~5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했다.
이 순위에 따르면, 1위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2위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3위는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4위 카뮈의 <이방인>, 5위 펄벅의 <대지>였다.
그리고 <붉은 수수밭>, <고도를 기다리며>,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밥 딜런), <좁은 문>, <황금 물고기>, <무기여 잘 있거라>, <닥터 지바고>, <수레바퀴 아래서>, <유리알 유희>, <양철북>,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이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1위를 차지한 <데미안>은 1919년‘데미안, 한 젊음의 이야기’란 이름으로 발표된 것처럼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의 청년시절 성장기록이다. 이 <데미안>을 고교시절 밤을 새워가며 읽으면서 다음의 구절에 꽂혀 빨간 밑줄을 그었던 기억이 난다.… ‘새는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또한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포기를 모르고 한계에 맞서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85일간의 사투기록 <노인과 바다>에서 얻은 명대사 구절 또한 두고두고 세상살이의 커다란 지침이 되기에 충분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인간은 파멸 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제 투명했던 가을햇살도 바스락거리며 바람 시린 겨울로 간다. 이밤, 추억어린 노벨상 소설 한 권 들춰보자. 현실 속 삶이 팍팍해도 소설 속 한 인간존재의 치열한 삶의 의지와 희망을 들여다 보는 것도 때론 크나큰 정신적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