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기자의 ‘세상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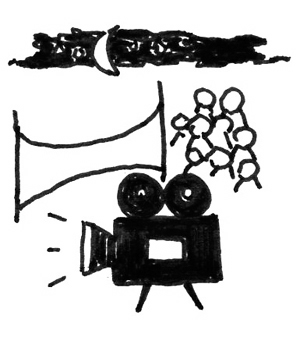
소위 ‘활동사진’이라 불리던 영화를 생애 처음으로 본 건 ‘국민학교’ 3학년 때였다. 시골마을에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으니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산만 벽촌의 아이들에겐 경천동지 할 빅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
지금처럼 번듯한 영화상영관이 있을 리 만무했던 터라 교실 두 개의 가운데 칸막이벽을 터서 강당처럼 사용하던 시청각교실에서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영화 관람을 했다. 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모두 검정 비로드 커튼을 꽁꽁 여며 치고, 교실 맨 앞 칠판 위에 이른바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두꺼운 흰 광목천을 내려뜨렸다. 교실의 불이 꺼지는 순간 차르르르~ 영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영화제목은 ‘화랑 원술랑’. 물론 흑백영화였다. 당시 최고의 인기배우였던 최무룡과 김지미가 주연을 맡았던 이 영화는 신라시대의 꽃미남 화랑이었던 원술랑의 조국애와 사랑을 그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다음으로 영화를 본 것은 여름방학 때 앞동네에 들어온 가설극장에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TV보급이 일반화 되기 전이라 특별히 작정을 하고 읍내 영화관엘 가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영화구경이란 건 꿈도 꿔보지 못할 시절이었다.
그런 궁색한 시골사정을 노려 추석명절 때나 여름방학 때가 되면 흡사 유랑극단 같은 영화 가설극장이 앞동네 너른 공터에 들어섰다. 공터 맨바닥에 빙둘러 기둥을 박고 어른 키보다 높게 휘장을 둘러치고는 간이 매표구에서 표를 팔았다.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며 영화를 상영하곤 했는데, 이때 본 영화가 흑백영화 ‘가는 봄 오는 봄’, 김진규, 최은희 주연의 컬러영화 ‘성춘향’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그 시절의 정경들은 마을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흑백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시나브로 자취를 감췄다. 동네에서 몇 안 되는 TV가 있는 집 마루며 안마당은 TV시청을 위해 마실 온 동네사람들로 북적였다. 일일연속극이며 TV쇼, 코미디 프로, 복싱과 레슬링 중계 등의 프로는 한낮 땡볕아래 논밭 일로 땀에 절은 시골사람들의 크나큰 낙이요 카타르시스였다.
그러저러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스테디하게 시청자들의 인기를 끈 프로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되던 ‘토요명화’와 ‘명화극장’이었다. 이 프로를 통해 말로만 전해 듣던 추억의 명화들이 전파를 타고 안방을 점령했다. 그런데 그 시절을 풍미했던 45년 역사의 KBS ‘명화극장’이 폐지된다고 한다. 영화 소비구조가 TV에서 영화관이나 VOD로 이동됐기 때문이라는 게 폐지이유다. TV방송의 기능과 존재이유가 꼭 시청률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 아닌데도 말이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나만의 생각일까….

